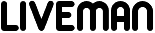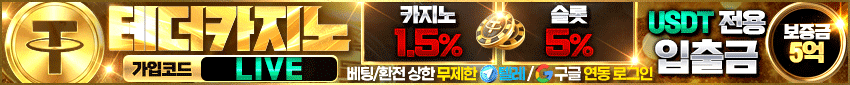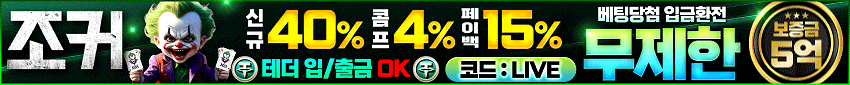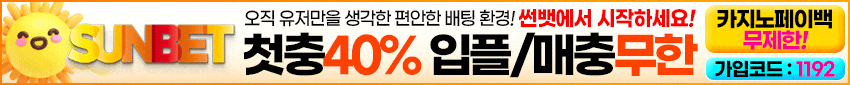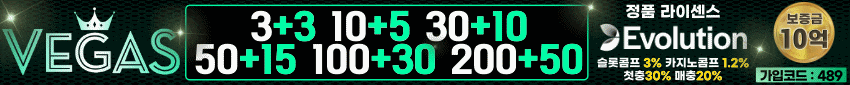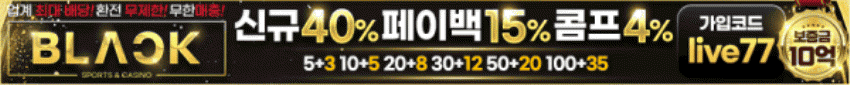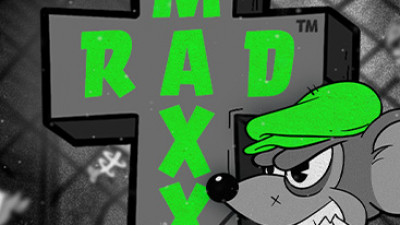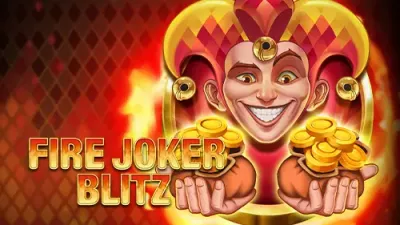일제강점기 한국어 맞춤법 때문에 싸웠던 이유
작성자 정보
- 커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92 조회
- 목록
본문


일제강점기 국어학계는 주시경파와 박승빈파로 나뉘는데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
주시경파 : 최대한 단어의 원 형태를 살린 형태주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늙은 노파 둘이 앉아있네요)
박승빈파 : 최대한 현실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노픈 곳애서 바라보니 늘근 노파 두리 안자잇내요)
===========
주시경파가 모인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는데,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이를 위해 겹받침을 공식 추가하여 받침만 25자가 되었습니다.
박승빈파는 오히려 받침이 많아져 철자법이 복잡해졌고 현실 조선말과 괴리가 너무 크다고 이 안을 크게 비판했으나, 제대로 된 표준 철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긴 국어학계가 조선어학회의 통일안 지지를 표명하며 총독부의 표준철자법을 이기고 전국 표준으로 자리잡습니다.

해방 후에도 남북한 모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남북의 국어정책을 공식 제정한 최현배와 김두봉 모두 주시경파였기 때문에 남북한은 맞춤법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두봉은 더 골수 형태주의자라서 조선어학회의 두음법칙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북한의 국어 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의무교육으로 두음법칙 없는 글을 배우면서 오랜 시간 습관이 된 두음법칙이 북한 사람들의 입말에서도 사라집니다.
과거 ’있읍니다‘도 형태주의의 흔적이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하여 ‘있습니다‘로 개정되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어 맞춤법 때문에 싸웠던 이유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